2021 새로운 출발 <9>
2016년 등단…글쓰기로 존재 증명
시집 ‘우리는 어쩌다 어딘가…’ 출간
박사논문 주제로 이성부 시인 연구
대학서 글쓰기 강의…평론집 계획도

문학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물론 보편적인 경우다. 하나는 ‘목을 매달아도 좋은 나무’라는 결기로 입문을 한다. 한편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끄적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작가가 된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오늘의 시대 문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본화된 사회에서, 자칫 ‘밥벌이’마저 어려울 수 있는 시대에 문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험’이다. 그러나 여전히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은 많고, 실제 소설집이나 시집을 발간하는 문인들은 줄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밀한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을 넘어 특권이기도 하다.
백애송 시인 또한 “중,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직업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학창 시절 거창한 작품을 쓴다기보다 다이어리나 수첩에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중앙문단에 널리 알려진 시인이나 평론가는 아니지만 그는 꿈을 이뤘다.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글을 쓰는 지금이 행복하다(학기 중에는 광주대에서 글쓰기 관련 강의를 한다.) 백 작가는 2016년 ‘시와 문화’, ‘시와시학’을 통해 각각 시와 평론으로 등단했다.
기자는 백 시인을 안 지 오래되었다. 2000년대 초반 광주대 문예창작과 석사과정을 공부하던 시절, 그는 조교였다. 대학원생 조교였던 그는 이제 시를 쓰고 평론을 하는 문인으로 성장했다.
얼핏 침착하면서도 서글서글한 인상이지만 내면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사실 아직 시를 잘 모르겠다”는 말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은근한 열망이 배어 있다. 곧이어 “서사보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시가 더 좋아서”라는 부연이 뒤따른다. 시를 먼저 쓰고, 뒤이어 작품을 분석하는 평론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연유 때문인가 보다.
“시는 쓰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다면, 평론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썼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철학이나 사상을 접목해 평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이의 작품에 대해 글을 쓸 때 최대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마음을 읽어보려 해요.”
그의 말은 ‘문학에 대한 예의’, 아니 ‘문인에 대한 예의’처럼 들렸다. 문학은 이편과 저편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라는 관점에서 보면 글쓴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헤아림의 시작은 지역,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문인들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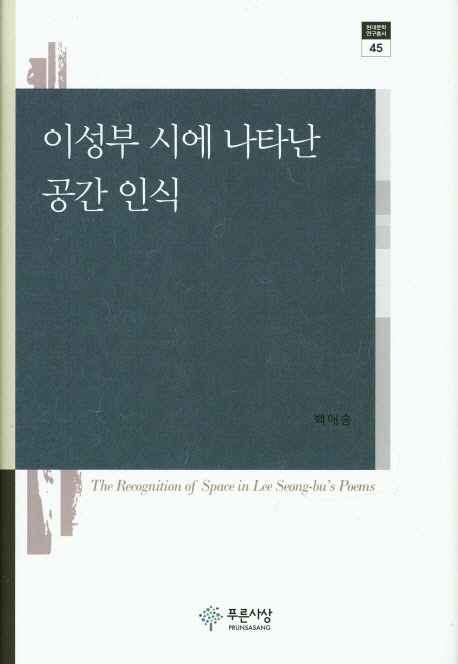
백 시인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광주 출신 이성부(1942~2012) 시인을 연구했다. ‘이성부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이 그것. “대부분 박사논문은 지역보다는 중앙에서 소재를 찾는” 경향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다. “지역이 있어야 중앙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레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명인 이성부를 택했다.
이밖에 여러 논문을 썼는데 ‘1980년대 한국사회의 모습과 시적 대응’, ‘영산강 시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연구’,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문법적 오류 분류와 개선 방안’ 등이 그것이다.
틈틈이 계간지에 계간평과 시인론 등도 부지런히 발표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강의를 하고, 방학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최근 나온 시집은 제목부터 낭만적이다. ‘우리는 어쩌다 어딘가에서 마주치더라도’(시와 문화)는 체념과 애정과 연민의 정서가 가득하다. 김규성 시인의 표현처럼 “저만큼의 거리에서 바라보다 한번 닿지도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 마저 하지 못한 숙제를” 하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아마도 시인의 체념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력’인 것 같다.
백 시인은 문청시절에 대해 “조교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선후배를 많이 만났다”며 “나이 든 만학도 외에도 시와 소설 등 각기 장르별로 개성있고 인간미 넘치는 문청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평론집을 엮어낼 계획이다. 그는 “저를 믿고 귀한 글을 맡겨 주신 분들에게 보답을 할 예정”이라며 “누군가 내 시에 평을 해준다면 참 설레는 일일 것 같다”며 웃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강의 준비를 위해 영상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강의를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고, 쓰고, 가르치고, 또 배울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애송 시인 “읽고 쓰며 시·평론 두 길을 가다”
문학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물론 보편적인 경우다. 하나는 ‘목을 매달아도 좋은 나무’라는 결기로 입문을 한다. 한편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끄적이는 것’을
kwangju.co.kr
광주 유일 생황 연주자 신선민 “생황 공연 많이 펼쳐 대중과 친해져야죠”
‘생황’. 이름부터 낯설다. 생황은 한국 전통 관악기로 국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다.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조선시대 풍류객이 즐겨 연주했으며 옛 문헌이나 그림 속에
kwangju.co.kr
윤미경 동화작가 “가치없다 생각되는 시간도 인생의 고마운 씨앗”
인생은 롤러콜스터와 같다고들 한다. 급전직하, 급전상승하는 롤러코스터가 인생을 닮았다는 것이다. 변화무쌍해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인 걸 보면 수긍이 간다. 곡성 출신 윤미
kwangju.co.kr
'박성천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 “역사·풍경·섬…여수 속살 101개 이야기로 담았죠” (0) | 2021.02.06 |
|---|---|
| 노포, 세월의 내공이 만든 브랜딩의 정점 (0) | 2021.02.05 |
| [광주 북구문화센터] “지역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합니다” (0) | 2021.02.03 |
| 사라지거나 파괴된 작품들로 다시 쓴 미술사, 뮤지엄 오브 로스트 아트 (0) | 2021.01.31 |
| 코카콜라, 2차 세계대전 통해 미국의 상징 브랜드 됐다 (0) | 2021.01.29 |



